숨이 멎을 때까지 우연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래 너 역시 동의할까
내가 너를 들여다보려 애쓰던 나날 네가 허벅지를 죽죽 그어 대던 장면을 본, 그 순간에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지 나는 그 장면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지만 끝내 우연
이라고 정의했다
네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 살의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궁금했고, 한번은 너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너는 자신도 누굴 죽이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살의는 그저 살의라며
그래 나는 슬픈 척 해도 들키지 않고 그래 죽고 싶다는 말을 삼킨 채 영원을 바란다 말하고 그래 이런 마음도 누가 엿볼 수 있는 걸까
내가 구토를 하면 너는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목뒤가 견딜 수 없이 가려워졌다
서로의 악취미를 숨기며 나는 알약을 너는 칼을 쥐고 그래 너는 이 모습이 가장 슬픈 마음이구나 생각했다 나는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살인자를 죽인 살인자를 죽인 살인자의 이야기
죽음은 미래의 마지막 모습이다 온전한 영혼 따위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후를 상상하면 몇 개의 거대한 문과 누군지 알 수 없는 심판자가 떠올라서 더는 조각날 수 없을 때까지 파편적으로 갈라지는 영혼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나는 나의 마음에 이름을 지어 주고 싶었는데
그것은 와르르 무너져 쏟아지는 진열장의 유리컵이거나 단거리 경주를 끝마친 심장이거나 바닥에 엎질러진 백색 알약이기도 했고 어느 날에는 감당할 수 없는 폭설과 맹목적인 살의, 목매단 사람의 발버둥 같은…… 나는 숨을 쉬기 버거울 만큼 발작하는 것들을 사랑했다 마음을 죽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데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싶었다
유리 위로 입김을 불면
물결이 새겨지는 것처럼……
어떤 이별은 견딜 수 없는 비명을 동반한다 새를 묻는 살인자는 새와 인간의 비명 사이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죽기 전 남자가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잘 가 다음에 만나, 였다 연인은 죽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따라갈 것이다 무거운 마음을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물속에 잠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여름의 익사자가 살인자의 발목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중력이 발생한다 내가 너를 끌어당기고
네가 나를 당기는
그래 너는 나쁘고 나는 나쁘고 우리는 나빠서 이런 마음으로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번지는 입김 위로 그림을 그리면
지문이 새겨지는 것처럼……
그래 나에게는 길고양이를 보며
눈을 느리게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지
속도라는 말이 무의미할 만큼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뜬다
알고 있었어 그 날 밤 너는 취한 몸을 비틀거리며 내게 쏟아졌고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 나는 무엇을 잊은 거냐고 물었고 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 나는 내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새벽의 색채에 대해서 물었지만 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 익사자의 연인에 대해 물었고 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 살인자를 죽인 살인자를 죽인 살인자와 세계의 우연과 우리의 규칙과 새와 인간의 차이점과 나의 마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 너는 죽이고 싶다고 말했고 누구를 죽이고 싶냐고 물었을 때 너는 말할 수 없다고 했지 다음 날 나는 지난 밤을 잊은 척 했다
기억해 봐
너는 피와 살밖에 없다고 했지만
내가 너에게 영혼을 바랄 때
마음은 이미 상해 가고 있었지
그래 너는 끝내 잠에 빠지고 그래 나는 슬픈 표정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으로 슬펐던 게 언제인지, 미래에 마지막으로 슬프게 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래 나는 너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래 나는 목소리를 망가뜨리고 마음을 소거하고
갈라지고
조각나고
호흡하고
갈라지고
조각나고
호흡하고
유리처럼 물결처럼
나는 문득 사라져
-
숲의 소실점을 향해_양안다 (민음의 시 271)

'남이 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 中 (0) | 2021.04.09 |
|---|---|
| [시] 아베마리아_최현우 (0) | 2021.04.07 |
| [시] 젓가락질 가운데_최현우 (0) | 2020.09.19 |
| [시] 하늘은 지붕 위로_폴 베를렌 (0) | 2020.08.11 |
| [시] 응_문정희 (0) | 2020.07.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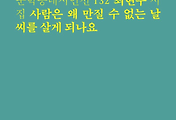


댓글